그래도 좀 숨기는 게...
"눈은 어디까지 보아야만 만족함이 있을까
일생 귀의 달콤함은 무엇인가
내 언어의 감동의 무게는...
내 감성은 창조의 원형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는가.
사랑 받고 있는 강아지의 미소를 본 일이 있습니까?
밭에 자라는 흔하디 흔한 채소의 성장을 눈 여겨 본 일이 있습니까?
그대는 자연을 호흡하며 이를 일반 은총이라 일컫지요?
그러시다면 손수 지으신 그분의 숨결에 오늘의 반응은 무엇인지요?
너무 바 삐 걷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 정작 보아야 할 것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분이 마당을 마련 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광대 짖이 가능 할까요?
그렇다고 아무데서나 메아리 없는 기교를 펼칠 수는 없잖아요"
때론 창문을 비스듬히 열고 내면을 공개하며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 앞에서는 창문을 조금 닫지요. 그런데 요즘 내 변명을 위해 창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의 본질 보다는 유형의 탑 쌓아가기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어지지 않으려 마음 다잡지만 어느덧 조급함에 젖어있는 나를 만납니다.
마음이 통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시골 조그마한 마을, 해풍이 산들 거리는 나지막한 산봉우리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 초라하게 보이는 교회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교의 능력을 어디에서도 쉽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 몸 추스리기에도 버거울법한데 오늘은 선교 부지 종자돈 헌금이라며 거금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가진 자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겠지만...
그 메일을 접한 순간 제 가슴은 무섭도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 위에 계신 분은 글로 표현할 것을 암시 하셨습니다.
내 자신 들킨 듯 싶은 빨갛게 상기 된 얼굴로 스치는 영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쑥스러움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창문을 조금은 닫아야 할까 봅니다. 하지만 많은 얼굴들이 여전히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냥 벗은 몸으로 모두에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탄자니아 선교의 한 귀퉁이에서 김종수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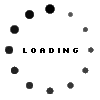
댓글0개